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6 - 일상이 그립다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이 깼다. 바나나를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 포타슘이 부족해서 그런가. 지난번 음식을 주문할 때 바나나 두 봉다리를 주문했는데 하나도 오지 않아 다른 음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 마스크도 아껴야 하고 사람이 많은 마켓에 자주 가는 리스크도 줄여야 하니까, 바나나를 먹자고 장에 갈 수 없어 참았었다. 하루면 가능했던 식품배달 주문도 일주일이 지나도 시간 잡기가 어렵고 그나마 주문하면 동이 나서 원하는 것을 얻기가 힘들다. 새벽 6시에 가게 열기 한 시간 전, 시니어를 위해 열어주는 특별 시간에 사람도 적고 물건도 있을 것 같아 길을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투에 나가는 마음으로, 리스트를 적고, 신속히 움직일 작전을 짜서 갔다. 서바이벌 모드로 이것저것 막 집어넣었다. 하루에 남편과 사과 반 개를 반으로 쪼개 나누어 먹었었는데 사과도 두 봉다리를 샀다. 서둘러 마켓을 빠져나오다 정작 달걀을 빠뜨렸다.
내가 좋아하는 오트(귀리)도 주문했는데 동이 났다고 언제 배달될지 모른다고 연락이 왔다. 인터넷을 뒤져서 "Rebel Smuggling" 한국말로 번역하면 "밀수꾼"이라는 곳에서 어제 오후 드디어 받았다. 재미있자고 붙인 이름이었을 텐데 그야말로 어디서 밀수를 했는지 조그만 오트 다섯 봉다리를 받았다. 오늘은 오랜만에 (몇 주 되지 않았는데 꽤 오래전 일로 느껴진다) 오트밀에 우유를 붓고 계피가루와 너트를 넣고 바나나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머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었는데....
Green-Wood Cemetry, Brooklyn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처럼 위협적으로 뉴욕을 덮치지 않았을 때, 3월 초에 브루클린에 있는 그린우드 묘지(Green-Wood Cemetery)에 갔었다. 답답한 아파트에 갇혀 있다가 멀리 교외로 가는 대신 집에서 20분 정도 운전해서 주차를 공동묘지 안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 것 같아, 전부터 오고 싶었던 이곳을 찾았다. 날이 아직 쌀쌀하고 꽃나무가 피기 전이어서 스산하긴 했지만 흥미로운 조각상들과 비석들, 다양한 건축양식의 묘를 볼 수 있었다. 많은 뉴욕의 유명인사들이 묻힌 이 묘소에서 마음에 짠하게 와 닿은 비석은 1858년에 찰스 그리피스(Charles Griffth)가 사랑하는 아내 제인(Jane)을 위해, 조각가 패트리지오 피아티(Patrizio Piatti)에게 위임하여 만든 비석이다.
비석머리에 "Jane My Wife"라고 새긴 이 조각은 한 폭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다. 아내가 출근길에 남편을 조신하게 배웅하고 있고, 조각이 세월에 닳았지만 브라운스톤의 집 문 앞에 강아지도 따라 나온 모습이 부인의 왼팔 뒤로 희미하게 보인다. 집 오른쪽으로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고, 남편은 부인에게 다정한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 같다. 아마도 매일 되풀이 되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일에서 와보니 심장마비로 아내가 숨져 있었다. 위의 조각은 남편이 아내를 본 마지막 장면이며, 이곳에 와서 부인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진다.
어린아이들의 묘소들도 군데군데 보였는데, 1830년대 뉴욕 콜레라로 인해 뉴욕 250,000명 인구에 3,515명의 사망자를 발생한,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해 어떻게 예방하는지도 모르고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다. 공동묘지에 있으니 죽음의 선상에서 삶을 관조하게 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부수적인 건지, 또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을 보게 된다.
지난달 김희헌 목사님께서 길목 연재에 인용하신 다석 유영모 선생의 글이 떠오른다.
"꽃을 볼 때는 보통 꽃 테두리 안의 꽃만 바라보지 꽃 테두리 겉인 빈탕(허공)의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꽃을 둘러싼 허공도 보아주어야 합니다. 무색의 허공은 퍽 오래전부터 다정했지만, 요새 와서는 더욱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크라이시스가 오니까 우리가 미처 느끼지도 못하던 빈탕(허공)의 얼굴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일상들을 위해 우리가 인식조차 못했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전선에 있는 의료진들, 지금처럼 홍수같이 밀려오는 주문을 배달하는 사람들, 건강을 생각하기 전에 생존이 다급한 사람들.... 오늘 나는 위험을 피한다고 새벽 시니어 아워에 장을 보았지만, 캐시어를 보고 있던 70대 돼 보이는 할머니를 떠올린다.
웨스트 빌리지 문 닫힌 상점 창가에 써놓은 메시지를 보니 눈물을 글썽이게 된다.
"Spring is coming"
"See you all soon"
"We love you West Village"
"Take care of each other"
일터를 잃고 수입을 잃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텐데. 사람이 아름답다.
뉴욕시에 곧 봄날이 오기를,
그래서 서로를 만날 수 있기를,
그때까지 각자 잘 돌보기를.
일상의 날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PS 그린우드 세미터리(Green-Wood Cemetery)는 1838년에 맨해튼의 묘지가 부족해지자 교외에 세워진 초창기의 묘지로 번스타인, 바스키아, 티파니, 듀크 엘링턴 등 유명 뉴요커들이 묻힌 곳이다. 478에이커나 되는 세미터리는 아름다운 조경과 조각들로 19세기에는 가족들이 함께 여행가는 명소로 나이아가라 폭포 다음으로 방문자가 많았다고 한다. 센트럴 파크를 비롯해 퍼블릭 파크를 형성하는데 영감을 주었던 곳이라고 한다. 제일 높은 피크에서 보면 맨하탄 남쪽의 전경과 자유의 여신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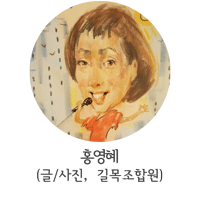
 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7 - 나의 피난처 , 호숫가 통나무집
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7 - 나의 피난처 , 호숫가 통나무집
 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5 - Donald Judd 의 의자가 보인다
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5 - Donald Judd 의 의자가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