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8 - 코로나 감빵면회
Rose B. Simpson, Pod IV & Pod III, 2011, Pottery, reed, cotton twine, pigments
하루 전날
내일은 거의 백일만에 손녀를 보러 간다. 외출금지령 이후 비상사태에 적응하느라, 또 서로 만나는 것을 조심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다음 주부터 클리닉이 정상 가동하니 아들이나 남편이 환자를 보기 전에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결단을 내렸다.
애들 만날 생각에 들떠 뭐 갖다 줄 것이 없는지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두 달 전 맨해튼에서 통나무 집으로 올 때, 혹시 만나면 준다고 에사 베이글( Ess-a- Bagle) 두 더즌을 사서 얼려 놓았었다. 언제 야금야금 먹었는지 3개가 남았다. 오동통하고 쫄깃한 에사 베이글은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다. 아껴 먹던 소람 음식점 얼린 만두와 예당 떡볶이 떡, 그리고 마른 버섯과 국수, 반건조 오징어 한 마리. 피난 살림에 가져갈 것이….
아들 생일이 6월 초인데 그때 볼 수 있을지 몰라, 케이크를 구워가려고 레시피를 찾아보았다. 코로나 방콕 생활이 뭔가 달곰한 것을 땅기게 하여, 얼마 전에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를 구해, 바나나 빵을 구워 하루 만에 홀랑 먹어버렸다. 버터나 크림이 많이 들어가는 케이크 대신, 친구가 쉽고 맛있다고 추천해준 “호주가이버” 사이트에서 사과빵을 찾았다. 조리도구와 계량스푼이 제대로 없어 고전했는데, 따끈하고 빵 냄새가 그럴듯하여 조금 떼어먹고 싶었지만 참았다. 재료가 되는 당근 빵을 하나 더 구워서 반반 나누어가자고 다시 일을 벌였는데 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남편을 불러 밀가루를 체에 치게 하고, 당근을 갈게 하여 반죽을 완성했다. 굽고 나니 심심해 보여 피칸과 해즐넛으로 스마일하는 눈과 입을 만들어 주었다. 반으로 나누면 모양이 빠질 것 같아, 결국 먹으려고 했던 계획은 무산되고 우리 부부는 침만 삼키면서 내일을 기다렸다.
트렁크에서 내일 입고 갈 옷을 찾았다. 이곳에서 옷이라고는 두 벌 가지고 살았는데…. 손녀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입고 갔던 유니클로의 키스 해링 (Keith Haring) 아기 그림 티셔츠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지금 배밀이를 시작한 손녀처럼 아가가 배밀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거나 챙겨 왔는데 이 뿌듯한 기분. 내일 가져갈 물건이 더 없나 살펴보았다.
화분에 옮겨 심은 파, 얼마 전에 새끼를 쳐서 분갈이한 아기 필리아(Pelia).
나의 가난한 짐보따리를 대충 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감빵 면회날
코네티컷 뉴헤븐 근처의 아들 집에 가려면 보통 지하철로 그랜드 센트랄 역까지, 기차로 두 시간, 또 내려서 우버를 타고 가면 세 시간이 걸린다. 점심을 먹고 2시간 보내고 다시오면 8시간이 걸리는 여행길이라 좀처럼 자주 보지 못하지만, 손녀가 생긴 후 한 달에 한 번은 가곤 했다.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여서 예년 같으면 엄청나게 말렸을 텐데, 차는 많았지만, 운전을 하고 두 시간 만에 도착했다.
Ana J. Kim, Erin이네, 2019
열린 문을 통해 빼 꿈 보이는 손녀는 어느덧 아가에서 아이처럼 보이고 위로만 치솟던 머리는 차분하게 내려와 꽃핀을 꽂고 있었다. 전화로 확대된 사진이나 클로즈업한 줌 미팅으로만 보다 실제로 만나니 훨씬 조그맣고 예뻤다. 우리를 보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불안해하다 결국은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 마스크를 쓴 우리 모습이 낯선가…. 아기를 꼭 안고 토닥토닥 진정을 해주니 울음이 잦아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는 걸 가슴으로 느꼈다. 플레이 팬에 함께 들어가 공놀이를 하다 나를 쳐다보면 울먹이려고 하여 얼른 다른 장난감으로 전환했다. 꼼지락거리는 발가락도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고, 통통한 발목과 살의 부드러움도 느껴보았다. 온라인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온기와 감촉.
마스크를 벗고 저만치 떨어져 아이들과 점심을 먹었다. 사과빵과 당근빵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남편의 잔소리대로 설탕을 듬뿍 넣어서 그런지 꿀맛이었다. 레이디 엠(Lady M)의 녹차 크레이프 케익이나 케이키(Keki)의 우베 치즈케익보다 더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전원일기”적인 이 분위기… 코로나 19 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정겨운 맛이 있었다.
두 시간 정도 면회를 하고 다시 두 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왔다.
면회 다음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여기저기 텅 비어 있었다. 엄마가 떠올랐다. 미국 딸네 집에 올 때 바리바리 싸 오셔서 냉장고를 들여다보시면서 “전에 엄마가 가져다준 것도 안 먹고 그대로 있네. 여기 맛있는 것은 다 있구나.“ 말씀하시곤 했다. 남편과 간단히 저녁을 먹고, 출출해 빵을 구웠다. 전에 “도브테일(Dovetail)” 음식점에서 식전에 나오는 비츠 빵이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당근 대신 비츠를 넣어보았다. 대충 밀가루도 체에다 거르지도 않고, 설탕도 거의 안 넣었더니 떡이 지고 맛이 그저 그랬다. 엄마 마음으로 구웠어야 했는데…
PS 1. 코로나 19 이후 세 번째 글인데 먹는 이야기를 계속 쓰는 것을 보면 매슬로( Maslow)의 제1단계 생리적-의식주의 욕구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나 보다.^^
PS 2.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갔을 때 Mother’s라는 브런치 집에서 이 그림을 보고 한참 멈추어 있었다. 어렸을 때 같은 그림이 우리 집에 걸려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사진을 찍긴 했는데 화가의 이름을 알 길이 없어 궁금했었다. 이 글을 쓰면서 열심히 구글을 하다 드디어 찾아냈다.
Roberto Ferruzzi (1853-1934)의 “ Madonnina”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1897년 베니스 비엔날레 2등 당선작이다. 화가가 성모 마리아나 아기 예수를 염두하고 그렸다기보다는 거리에서 11살 여자아이가 한 살 된 아기 동생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한다. 화가의 이름보다는 그림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성화로 쓰여 친숙하게 기억된다. "Madonnina"는 “Little Madonna” 라는 뜻으로 "Madonna of the Streets"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 원본은 아쉽게도 현재 행방을 모른다고 한다.
Mother’s 음식점, Roberto Ferruzzi, Madonn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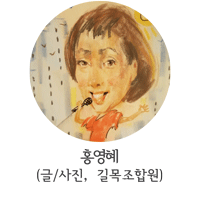
 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9 - 거미 숲속 넝마주이
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9 - 거미 숲속 넝마주이
 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7 - 나의 피난처 , 호숫가 통나무집
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27 - 나의 피난처 , 호숫가 통나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