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4 - 최소한으로 살기
지난해 끝자락, 웬델 베리의 <포트윌리엄의 이발사>라는 절판된 책을 빌려 읽었다. 주인공은 고아로 신학을 공부하다 이발사가 되어 고향 강변 오두막을 빌려 산다. 마을 사람들은 외딴곳에 사는 그를 일부러 찾아가 담소를 나누며 이발을 하고는 형편껏 돈을 놓고 간다. 미용 기술 없음을 한탄하는 글쟁이인 나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처럼 오두막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꾸민 포트윌리엄의 이발사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과 몸을 일체화시켜야 한다. 하여 그 준비과정으로 정읍에서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강화섬쌀백미2kg, 무농약검정보리1kg, 유기농수수500g, 즉석현미국수4컵, 동결미역국2포, 동결시래기된장국4포, 한우사골농축액10포, 사과2kg, 귤1kg, 양파3, 감자2, 당근1, 마스코바도유기농설탕1kg, 민속죽염250g, 유기농마늘가루140g, 흑통후추30g, 현미유500mg, 맛간장500g, 된장500g, 고추장500g, 국멸치와 다시마 조금, 파 두 뿌리, 쌀누룽지1포반, 가파도청보리미숫가루, 유정란15알, 구운유정란7알, 호밀바게트5조각, 공정무역 볶은 아몬드, 커피, 국화차, 생강차, 감잎차, 결명자차, 영양제, 작은 쁘티첼1, 멸치볶음과 검은콩자반 조금씩, 그리고 배추김치 한 통.
이상 준비해온 식료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오래 된 코펠세트, 플라스틱 도마, 세라믹 과일칼, 대접 두 개, 은수저 한 벌, 등산용 스텐 컵과 도자기 컵, 보온도시락, 큰맘 먹고 산 1인용 압력밥솥, 빨래비누, 주방세제
오두막에는 많은 물건을 구비할 수 없을 것이다. 구색 맞추기를 포기하고 갖고 있는 기본 용품만으로 생활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와 물자를 얼마큼 아낄 수 있는지, 적게 쓰는 만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실험해 보고 싶었다.
몸에 좋은 것을 적게 먹는다. 20여 년 전 틱낫한 스님의 <화>에서 배운, 유기농산물을 먹으며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아침엔 누룽지와 사과 반쪽, 점심은 차에서 즉석3분 현미국수와 구운 유정란, 귤, 믹스커피, 저녁엔 남은 사과 반쪽과 밥과 찌개와 김치와 밑반찬. 밤에는 아몬드와 생강차.
1인용 압력솥에 밥을 하면 이틀은 먹는다. 한 끼는 따끈하게, 다음부터는 볶음밥이나 물에 끓인 밥을 먹었다. 찌개나 국은 저녁에만 먹었는데 한 번 끓이면 이삼일은 먹었다.
소변 후에는 휴지 대신 가제수건과 작은 타월을 사용했다. 세탁기 사용 대신 되도록 손빨래를 했다. 냉장고를 쓰지 않았다. 무서워도 방만 남겨두고 주방은 일찍 불을 껐다. 기름보일러는 실내온도 19도에 맞췄다. 외풍이 세서 손님용 이불 두 장을 덮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니냉장고에 전원을 켰다. 달걀과 썩어들어가는 채소 때문이었다. 원주 토지문화관에서는 제공되는 밥을 먹고 간식을 하지 않으니 6월에도 냉장고를 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취사를 하면서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어려웠다. 서울에서 두터운 면이불을 가져왔다. 아침 식사는 거르는 게 편했다. 습관처럼 챙겨먹는 끼니를 허기지기 전에 미리 챙기지 않기로 했다. 뭐든 몸이 요구할 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현미국수가 질릴 때쯤, 구운 달걀과 귤도 떨어졌다.
최소한으로 살기 한 달 반, 마트에는 한두 번 갔을 뿐이고 꼭 필요한 생필품만을 샀다. 점심시간마다 자동차에서 식사를 했다. 학원까지 왕복 15km를 걸어볼까도 했었지만 외식비 대신 주유비를 택했다. 소비가 줄어들수록 간소해지는 삶은 주변정리로 이어졌다.
설날, 마침내 정원의 배롱나무를 위협하는 두릅 두 그루를 밑동까지 잘랐다.
그날 밤 저수지에서는 철새들이 떼로 꽥꽥 울어댔다. 밤에도 새가 운다는 걸 처음 알았다.
다음 날, 하룻밤 묵고 가는 주인이 넌지시 던진 “농사도 지어 봐요.”가 신호탄이 되었다.
일단 뒤꼍 텃밭 구석의 두릅 한 그루를 톱으로 잘랐다. 그리고 가운데 들깨더미를 낫으로 베어냈다. 앵두나무 두 그루를 뒤덮고 있는 마른 넝쿨을 싹 걷어내고 온 밭에 널린 마른 잡초를 쇠스랑으로 긁어냈다. 때마침 연락이 된, 40일 단식 후 보식 중인 나무(성미선 녹색당 운영위원장)가 너무 깊이 경운하면 땅속 탄소가 공기 중으로 노출된다고, 그래서 무경운 농법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고급 정보를 주었다. 살살 쇠스랑을 쓰다가 가운데 벽돌 다리를 발견했다. 보물섬 지도를 발견한 양 갑자기 신이 나서 돌다리를 몽땅 드러내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했다. 가끔 자신도 놀라는 저돌성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그랬다. 11시부터 16시까지 장장 다섯 시간, 머리 위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군무를 올려다볼 때가 아니면 허리 펼 줄을 몰랐고 그때까지 먹은 거라곤 집주인이 주고 간 쑥떡 한 조각과 커피 두 잔. 식사도 잊고 즐거움에 빠져든 노동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이 났을까? 나는 낡은 것이 정비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좋았다. 그리고 흙과 나무와 함께하는 육체노동 자체가 좋았다. 그러나 앞서가는 마음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육신인지라 그날 이후 보름 넘게 근육통으로 손목을 쓰지 못했다.
백기완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 정읍에는 눈이 내렸다. 그 다음 날에도 폭설이 계속됐다. 제설차보다 견인차가 더 많은 아슬아슬 눈길이 사라지자 고난의 사순절이 시작됐다. 선생님은 “딱 한 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고 하셨다. 어렵사리 개강해 석 달 내내 다음 시간을 예정할 수 없던 포항 강의는 2월이 다 지나기 전에 온라인으로 간신히 종강했다. 전주까지 가서 국가자격시험도 치렀다. 섣달 보름에 본 달무리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 벌써 정월 대보름이다. 겨우내 하염없이 내리던 눈을 처연하게 바라보던 정읍 생활이 차츰 익숙해진다. 오두막 크기의 군더더기 없는 생활, 간소하고 단순한 삶을 정읍 정원에서 한 발 뗀다. 이제는 정말 봄이 오려나. 아마도 다음 겨울에나 볼 함박눈을 봄맞이 선물로 드린다.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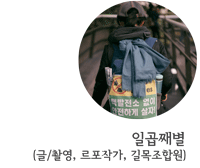
 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5 - 정원에 피어난 봄
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5 - 정원에 피어난 봄
 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3 - 설원의 눈, 물
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3 - 설원의 눈,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