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없는 정원일기 1 - 기다림마저 비움
돌아보니 작년 이맘 때 ‘1일 1비움’을 썼다. 탈핵도보순례를 시작한 이후로 나는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소유물을 남기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 쉬울 줄 알았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보험을 들어야하는 것처럼 세상은 책임이라는 이름의 소유를 강요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거창한 화두는 아니더라도 되도록 돈 욕심 내지 않고 비우며 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원하는 게 조금은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존엄성을 지키고자 고안해낸 방안으로, 남의 집 정원을 가꿔주거나 남의 논밭에서 일을 해 주고 홀로 계신 시골 할머니를 돌보며 방 한 칸을 얻어 사는 것이 상부상조 나눔과 공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해타산은 상호관계라 내 계획과 남의 방식이 달랐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간 자가 웃음으로 단을 거두리로다’가 평생의 좌우명이었건만, 행복하게 심었기 때문이었는지 내가 심은 배추와 무는 결국 뽑지도 못한 채 오매불망 가고 싶어 했던 별담리엔 가지 못한다. 입에 담기도 싫은 바이러스의 훼방은 상상 이상으로 인생에 치명적이었다.
‘대나무에게 구하는 양해’를 읽은 친한 친구가 그랬다.
‘난 배롱나무가 꼭 너 같다. 누군가 널 대나무 숲에서 꺼내주길 바라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배롱나무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구해주었던 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내 모습을 나무에게서 보았기 때문일지도. 그러나 구원은 타인에게서 오지 않는다. 나는 구원자에게 잘 보여 구출되기를 포기했다. 구원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은 아무리 회개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정원이 없는 나는 근 두 달간 거의 집에서 1996년 영화 <은행나무 침대>의 눈 맞던 황 장군처럼 꼼짝 않고 지냈다. 서울에서 최선의 방역은 두문불출과 거리두기였으므로.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있는 내 눈 앞 창가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키우셨던 접난, 원주토지문화관 시절에 선물 받은 고무나무, 잎만 잘 따주면 일 년에도 몇 번씩 분홍 꽃을 피우는 밀레니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버린 토마토 캔에 옮겨 심은 몬스테라가 있었다. 틈틈이 쌀뜨물을 주었지만 화분 넷으로 정원을 대신하기엔 어림없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나는 메마른 화초들에 배양토를 채워주고 영양제를 꽂아주었다.
이브 저녁에는 큰맘 먹고 밖에 나가 화분을 하나 샀다. 뿌리가 캔 밖으로 뻗어 나오는 몬스테라를 위한 것이었다. 무거운 도자기 화분과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사던 빨강초록 포인세티아를 들고 2km를 걸어오니 팔이 후들후들 떨렸다.
영화 <러빙 빈센트 Loving Vincent>를 보던 크리스마스 새벽에 분갈이를 해주려 했지만 몬스테라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
날이 밝자 다시 시도해 보았다. 몬스테라는 토마토 캔과 한 몸이듯 모종삽으로 가장자리를 아무리 후벼 파도 떨어지질 않았다. 줄기를 잡고 뽑듯이 들어 올려도 보고 거꾸로 뒤집어도 보았다. 우선은 캔으로부터 화초를 분리해야 옮겨 심던지 할 텐데 몬스테라의 뿌리는 아교로 붙인 듯 질기디 질겼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는데 옛 틀에서 나오지 못하는 꼴이 마치 아집과 고집과 독선과 원리원칙으로 똘똘 뭉친 내 꼬라지 같았다. 한참 용을 쓰는데 뚝 소리가 났다. 여러 뿌리 중 하나가 끊어졌나 했는데 두 줄기 중 가운데 줄기가 부러졌다. 화초를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해 주려다 목숨 줄을 절단 낼 지경이었다. 구습에서 벗어나려면 팔이나 다리 하나 잘리는 건 각오해야 할 정도의 희생이 따르는 걸까? 순간 성경의 그 비슷한 구절이 머리를 스쳤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43)
그러나 몬스테라 뿌리 뭉치가 단단한 건 잘못이 아니었다. 그 애는 살고자 뿌리를 내렸을 뿐이고 마구잡이로 잡아당긴 내 탓이었다. 비좁건 말건 그대로 놔둘 걸 괜한 짓을 했나 후회스러웠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싶었지만 혼자 해내야 했다. 금속과 흙의 성질을 고려해 물을 붓고 캔을 발로 쾅쾅 밟았다. 캔이 우그러지자 마침내 화초가 분리되었다. 캔보다 두 배는 큰 연파랑 화분에 기름진 혼합배양옥토를 붓고 똘똘 뭉친 몬스테라 뿌리 덩어리를 넣고 다시 흙을 채웠다.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으니 그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다 심고 보니 큰 줄기 둘 중 하나는 안정적으로, 하나는 자잘한 뿌리만 흙에 심긴 채 공중에 떠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워낙 번식력이 좋은 식물이라 남은 뿌리와 다른 줄기로 어떻게든 자라지 않을까, 그 생명력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 것은 알을 깨는 고통만큼 쉽지 않다. 고난이 없이는 달라짐도 나아짐도 없다.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살이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며칠 전 해진 속옷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모처럼 언행일치를 본 듯 기분이 좋았다. 버릴 만큼 버리고 남은 옷과 신발과 가방을 그렇게 낡을 때까지 쓰다가 버리면 소유물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잡는다고 잡히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버렸다. 무얼 더 버려야 할까? 칭찬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제 나는 돕고 싶은 의욕조차 버려야 할 것 같다. 돕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일이 되어 버리고 나는 또 일 중독자처럼 앞뒤 안 가리고 그것에만 몰두할 것이다. 어쩌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돕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설픈 의협심과 치우친 동정심과 과장된 의미부여를 버리자. 나는 트렁크에 짐을 잔뜩 싣고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한 채 하루하루를 유목민처럼 살고 있다. 언제가 정착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닌 정원을 찾을 때까지 이 방랑은 당분간 계속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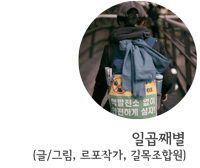
 별담리 정원일기 2 - 대나무에게 구하는 양해
별담리 정원일기 2 - 대나무에게 구하는 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