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7 - 할머니 사랑
매일 아침 9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차를 몬다. 달리는 내내 설레지 않는다. 누런 대나무 숲 앞집 초록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문요양 태그를 하고 이불을 털어 널고 쓸고 닦고 빨래를 하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서도 안 하던 일을 밖에서 하고 있다. 어르신과의 사이는 괜찮다. 다만 무료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창의적인 일을 하던 내가,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내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할 것까진 없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 나날이었다.
하도 심심해서 정리수납전문가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했다. 정리정돈·풍수지리 등은 20여 년간 이미 수십 권의 책을 읽은 터라 굳이 돈 들여가며 배울 필요는 없었지만, 이 시기에 자격증 하나라도 따놓자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옷 개는 법, 수건 접는 법 등 잔재미가 생겼다. 비움 실천을 하는 내게는 이제 버릴 게 별로 없다. 하지만 바로바로 실습할 수 있는 어르신 댁이 있지 않은가. 마침 어르신도 손댈 수 없이 뒤죽박죽인 서랍장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다.
정리의 4단계 원칙인 ‘처분-제자리-분류-수납’에 따라 안방의 TV 놓은 서랍장 네 개를 싹 정리했다. 거실 장식장의 그릇과 옷 서랍 네 개와 싱크대도 차례로 정리를 했다. 냉장고는 청소와 물품 정리 외에는, 괜히 버렸다가는 가져갔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공간이므로 더는 손대지 않는다. 못 입는 옷가지들과 유효기간 지난 화장품이나 약품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구획하고 정리한 서랍들을 보자 잠시 기분이 밝아졌다.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이 말끔한 정리 상태를 못 보시는 게 아쉬워 손으로 더듬어 만져보시게 했다. 그러나 정리가 시들해지자 다시 지루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어르신의 요 커버를 벗겼다. 실로 시쳐야 하는 요였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자 어르신은 ‘장하다’고 하셨다. 실밥을 뜯어 세탁을 하고 말려, 쓸고 닦은 방에 요 껍데기를 솜 아래 위에 가지런히 놓고 돗바늘에 굵은 무명실을 꿰었다. 그 사이 어르신은 생강을 심는다고 마당으로 나가셨다.
조용한 방안에서 한 땀 한 땀 요를 꿰매는데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자그마한 방을 가득 메운 목화솜. 솜을 틀어 얇은 싸개로 싸맨 후, 공단과 면으로 된 위아래 홑청을 빨아서 풀을 먹여 다듬잇돌에 방망이질을 해서 이불과 요를 시치셨던 엄마. 뿌연 형광등 아래에서 엄마가 이불과 요를 꾸미던 그 저녁 시간은 시계가 정지한 것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수선화가 교화인 명문여고에서 발레와 수예를 배운 엄마는 중학교 2학년이던 열네 살 때 교회에서 만나 10년을 연애하고, 결혼 직전 쫄딱 망한 부잣집 남자와 단칸방에서 어린 것들과 살았다. 그러면서 당시에 유행하던 과외를 못 시키는 대신 나를 직접 가르쳐 국민학교 1학년 첫 시험에 네 과목 올백을 맞게 하셨다. 엄마는 매일 아침 내 머리를 양 갈래로 묶어 고대기로 말아주셨다. 할머니가 부자 여동생 네서 얻어다 주신 한 학년 위 친척의 옷으로 나는 전교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아이였다. 학교 아무도 우리의 가난을 몰랐다.
외아들의 첫 아이인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아기 때 방바닥에 놓인 적이 없다고 한다. 아빠 아래로 네 명의 고모들이 번갈아 안으려 순서를 기다렸고, 할아버지는 고모들에게 내 발을 입에 넣으면 당시 크림빵 한 개 값인 10원씩을 준다고 하셨단다. 외아들밖에 모르시던 할머니는 첫 손주인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언제나 내 궁둥이를 두드리며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열네 살에 청천벽력으로 엄마가 돌아가시자, 그때까지 교회만 다니시던 할머니는 내 도시락에 온 정성을 다하셨다. 노란 달걀을 풀어 주황색 당근과 초록색 파를 송송 다져 달걀말이를 하고 분홍색 소시지를 달걀 물에 묻혀 부쳐주셨다. 내 도시락 반찬의 그 고운 색은 친구 엄마가 보고 감탄할 정도였다. 소풍날이면 다진 소고기를 양념해서 김밥을 싸주셨는데 김 위에 달걀지단을 깔아 입이 터질 정도로 커다란 김밥의 맛은 지금도 입 안 가득 배부르게 떠오른다. 할머니는 내가 스물여덟 살이 될 때까지 매일 아침식탁을 차려놓으셨다. 하지만 나는 매일 늦게 일어났고 학교로 직장으로 젖은 머리칼 말릴 새도 없이 뛰쳐나가면서 그 밥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자란 나는 전형적인 여성 역할이라고 여겨지던 집안 살림을 등한시했다. 티도 안 나는 비생산적인 일이 싫었다. 그런 내가 지금 젊어서도 열심히 안 하던 살림을 남의 집에 와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깥에서 어르신의 호미질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눈물방울이 투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숨죽여 울었다. 울음은 오열로 변했다. 요에 눈물이 떨어질까 봐 얼굴을 당기면서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다. 대체 왜 나는 이 낯선 고장에서 모르는 할머니 요를 꿰매고 있는 걸까? 그토록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던 엄마와 할머니께는 밥상 한 번 차려드린 적이 없는데 매일 남의 할머니 밥상을 차리다니, 아무리 엄마나 할머니가 그리워도 30여 년간 글만 쓰다가 엉뚱하게 노인을 위한 일을 전적으로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내 돌봄의 근저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할머니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노긋노긋해졌다.
원주에도 별담리에도 할머니가 계셨다. 그분들은 나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셨다. 차라리 딸 삼자고 하셨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양어머니와 양딸처럼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지도. 그러나 며느리는 아들과 내가 잘 맞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관계는 무조건 사랑하는 할머니와 손녀 혹은 어머니와 딸이었지 한국 전통사회의 고부관계라는 상하관계가 아니었다. 어르신과 내가 잘 지내는 이유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라는 대등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할 일과 못 할 일을 구분할 줄 알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어르신이 생강을 심고 내가 요를 꿰매는 것처럼. 그러나 규정에 따라 깍듯하게 전산 처리되는 우리 사이에 깊은 정이 쌓이기는 쉽지 않다. 정은 거래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두 달간 매일 찾아갔던 원주 할머니를 기억한다.
나는 며느리처럼 모셨던 별담리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요양보호사로 대상자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이분께도 정이 들까봐 겁이 난다. 헤어짐은 마르지 않는 눈물과 함께 가슴이 매섭게 아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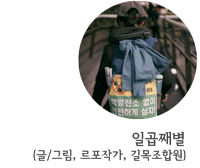
 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8 - 달팽이 집
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8 - 달팽이 집
 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6 - 빨간 앞치마 지비
꼬마 정읍댁의 정원일기 6 - 빨간 앞치마 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