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세상 - 꿈을 산다
자연을 예찬한 책 <월든>의 저자이자, 미국의 자연주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가 죽음을 맞이할 무렵 한 신부가 ‘소로’를 찾아왔다. 신부는 그에게 또 다른 세상을 언급하며 종교적 위안을 주고자 했다. 그러자 그는 보일 듯 말 듯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죄송하지만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45세에 세상을 떠난 소로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보낸 나는 오늘도 두 개의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다. 밤과 낮, 이 두 세상은 나에게는 너무나 극적이었다. 낮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별로 큰 차이 없이 지내지만 문제는 밤이었다. 내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아주 어렸을 때를 빼고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꿈을 꾸었다. 전생에 집시였던 것처럼 어디인지도 모르는 산천을 누비면서 끝없이 끝없이 배회했다. 깊은 골짜기, 낭떠러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벽 등 험한 곳을 다리가 아플 만큼 헤맨다. 꿈을 꾸는 동안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옷이 흥건하게 젖는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언제나 나 홀로였다.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쫓기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허둥대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서 목놓아 울었다.
왜 그토록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인지 꿈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기도 하고, 친분이 있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도 했다. 정신과 의사는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데 대개는 잠이 깨면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 꿈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다. 나의 경우는 꿈의 내용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소름이 끼치기도 한다. 언젠가는 꿈꾸는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날밤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웠다. 배가 고프고 피곤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뿐이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일은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었고 내가 밤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는 이 꿈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어났다.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야말로 나의 혼을 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계시(啓示)가 나를 휘몰아쳤다. 득도를 했다고 할까? 바로 ‘두 세상을 살자’였다. 꿈도 한 세상이라면 그 세상을 피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니 어스름해지는 황혼이, 밤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낮 동안 알차게 산 나에게 밤에는 또 다른 꿈의 세상이 올 것인가 궁금하기까지 하다. 두 개의 세상을 함께 사는 나에게 ‘소로’의 두 세계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한다. 어차피 세상은 두 개 또는 그 개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블랙홀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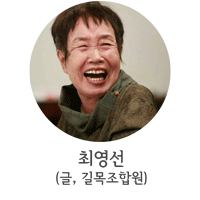
 발에 대한 헌사
발에 대한 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