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혜의 뉴욕 스토리 49 : 워싱턴 스퀘어 파크의 삼인 삼색 - Dancer, Dosa man & Rosé man
Sue Cho, “Dosa Man”, 2022 April, Digital Painting
그리니치 빌리지로 이사 온 지 어느덧 3년, 지난 2년은 팬데믹으로 칩거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신통한 나의 산책 루트를 개척하지 못했다. 로어 맨해튼(Lower Manhattan)은 Ave 와 Street로 바둑판처럼 나누어진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을 따르지 않고, 고유의 길이름과 빗변으로 가다 꺾이는 길들로 인해 헤매기 일쑤다. 어차피 지도 읽는 것에 약한 나는 아예 전화 네비게이터를 꺼놓고 하루는 이 길 따라, 또 하루는 저 길 따라 몸으로, 감으로 길을 익혀간다.
나의 우왕좌왕 산책길에 워싱턴 스퀘어 파크(Washington Square Park)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팬데믹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작년 여름 한참 마약과 범죄가 빈번해지고 치안이 좋지 않았다. 집회가 있는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일 땐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뉴욕시에 아시안 혐오 범죄들이 끊이지 않아, 가능한 어두울 때 다니지 않고,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닌다. 혹시 내 뒤에서 누군가가 떠밀지나 않을지,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길을 가로지른다. 이렇게 잔뜩 조심하고 산책을 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10에이커가 조금 못 되는 공원은 NYU(뉴욕대학)건물로 둘러싸여, 캠퍼스가 없는 학생들에겐 광장의 역할을 한다. 봄이 되니, 밴드, 춤, 무료 타이치 강습 등 문화행사와 이벤트가 시작되고, 학생, 주민, 여행객들로 붐비니, 공원에 다시 싱그러운 에너지를 느낀다. 막 피어나는 꽃들과 함께 화사한 봄기운이 긴장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거두게 하고, 봄을 있는 그대로 잠시 즐길 수 있음이 문득 고마워진다. 그간 워싱턴 스퀘어 파크를 거닐면서 내 눈길을 끌고 마음의 가드를 내리게 해주었던 세 사람을 소개한다. 일본, 스리랑카, 세인트 루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다.
Dancer, Let Hair Down

나는 추운 날이나 눈비로 궂은 날은 어김없이 워싱턴 스퀘어 파크를 찾는다. 한적하고 습기를 머금은 날 공원을 거니는 게 좋다. “오늘은 이렇게 추운데 설마 안 나왔겠지.” 하면 언제나 예상을 깨고 오후 네시경 즈음에 분수와 아치 사이에 하얀 큰 종이를 깔고 춤을 추는 동양 여인을 만나게 된다. 혹시 한국 사람인가 물어보았는데 일본에서 댄스를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고 한다. 펼쳐진 하얀 종이 끝엔 @Let Hair Down이란 가명이 쓰여 있다. “예의를 차리려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릴랙스하고 진정한 너 자신이 되어 즐기라”라는 관용구라고 한다.
날이 추워서인지, 준비운동을 야무지게 하고 몸을 푼다. 친숙한 클래식 음악이나 팝송을 소프트한 볼륨으로 틀어놓고, 묶은 긴 머리를 풀고 춤추기 시작한다. 헐렁한 옷차림에 물 흐르듯 한 자연스러운 춤사위는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어떤 땐 발에다 검정페인트를 칠하여 춤을 추는 동안 종이 위에 발바닥 페인트를 그린다. 바로 뒤에서 시끄러운 밴드 음악 소리가 날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연하게 자신의 춤을 이어나간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 (Angela Duckworth)는 뛰어난 재능, 지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해나가는 그릿(Grit)이 성공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열쇠라고 했다. 그녀에겐 그릿이 있는 것 같다. 아무도 공연하지 않는 추운 날씨에도 거르지 않더니 이젠 개선문과 분수대 사이, 워싱턴 스퀘어 파크의 명당자리에, 그녀의 춤을 보러 모여드는 이곳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가 저녁을 준비하러 정육점에 다녀오는 길에 댄서와 주로 조우하는데 집에 오면 장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고 음악을 튼다. 풀어헤칠 머리는 없지만, 릴랙스하고 음악에 맞추어 방구석에서 몸을 풀다 보면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들이 먼지 털리듯 날아간다. 무브먼트는 언제나 옳다.
https://www.curbed.com/2021/09/kanami-kusajima-dancer-washington-square-nypd.html
Dosa Man
워싱턴 스퀘어 파크 남서 쪽에 유명한 Dosa Food Cart가 있다는 것을 이번 겨울에 알았다. 오랫동안 거기에 자리 잡았다고 하던데, 아이들 놀이터와 Dog Park 근처여서 잘 못 본 것 같다. 추운 겨울이어서 공원이 텅 비었는데 줄이 긴 것을 보면, 뭔가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 가보니 도사(Dosa)를 팔고 있었다. 도사는 쌀과 렌틸(Lentil)을 갈아 반죽을 발효해서 크레이프처럼 얇게 부친 음식이다. 남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유래된 음식인데, 건강한 베지테리안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도사는 몇 년 전 버몬트 여행길에서 처음 먹어 보았다. 점심 먹을 식당을 구글했더니 뜻밖에도 브래틀보로(Brattleboro) 근처 Dosa Kitchen이라는 Food Truck이 나왔다. 주인은 맨해튼의 인도음식점에서 일하다 버몬트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그때 먹어 보았던 쌉싸름하면서 묘한 크레이프의 맛이 입안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다시 도사를 만나다니.
지나갈 때마다 줄이 길어 엄두를 못 내다, 오늘 드디어 마음먹고 기다렸다. 30분 정도 지났는데 몇 사람 앞에서 “Closed“ 사인을 붙였다. “아니 이렇게 기다리게 해놓고는” 했는데 줄 선 사람들까지는 여분이 있나 보다. 마살라 도사(Masala Dosa)와 스페샬 판디체리 도사(Special Pondicherry)를 주문했다. 대표적인 마살라 도사 (9불)는 감자 으깬 것과 양파 볶은 것을 속에 넣어서 삼바르 (Sambar)나 챠트니(Chutney)에 찍어 먹는다. 스페셜 판디체리(10불)는 야채가 더 들어갔는데,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한다. 사모사(Samosa)는 삼각형 모양의 패스트리로 그 안에 커리, 감자 으깬 것이 들어있는데 3불이다. 도사는 즉석에서 만들어 줄을 서지만, 사모사는 이미 만들어 놓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다. 매운 정도는 소스를 넣지 않거나, medium, hot으로 주문할 수 있다.
도사 맨은 스리랑카에서 온 이민자로, 공사장 인부부터 시작하여, 20년 전 13,000 불로 Food cart를 장만하고 지금은 유튜브 조회수가 16M이상 되는 널리 알려진 도사 맨이라고 한다. 레서피는 할머니로부터 배웠는데, 요리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을 명심하며, 건강하고 한결같고, 10불 미만으로 먹을 수있는 도사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오전11시나 11시 반 사이에 열고 오후 3시경에 마감하지만, 그 전에 다 팔릴 수 있으니 일찍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개인적으론 버몬트에서 먹은 도사가 빠삭하지 않고 부드러워 좋았던 것 같다. 다음번 주문할 땐 크레이프를 덜 바싹하게, 맵지 않은 맛을 고를 것 같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사모사도 커리 감자 고로께처럼 맛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xt4YCIsn2I
Rosé Man
Sue Cho, “The Rose Seller”, 2022 April, Digital Painting
워싱턴 스퀘어 파크 동남쪽 코너 건너편에 NYU Bobst 도서관이 있다. 지난 가을 부터인지 도서관 옆 모퉁이에 장미를 파는 사람이 눈에 띈다. 나이가 지긋한데 보라색 베레 모자와 은빛 머리, 렘브란트인지, 그의 그림 속 인물인지를 연상시킨다. 매일은 아니지만 오후 시간에 종종 만난다. 많지도 않은 3 다즌 정도의 빨간, 하얀, 분홍 장미가 조그많고 긴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다. 한 송이 장미를 손에 들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로제, 로제”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외친다. 카리비안 섬 세인트 루시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Yale대학 주변에서도 오랫동안 장미를 팔았다고 한다. 아주 춥거나 더우면 장미가 상하니까 날이 좋을 때 나온다고 한다.
나를 위해 장미 한 송이를 선뜻 사게 되지 않다가, 친구가 방문하는 날, 분홍장미 한 송이를 5불 주고 샀다. 열흘이 지났는데 한 송이 장미가 고개 숙이며 예쁘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전에 “나이를 잘 먹는 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다 길에서 만나는 노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열심히 책을 읽는 노인, 머리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화장을 한 노인,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을 탄 노인, 그리고 장바구니와 함께 꽃을 안고 버스에 오른 노인…. 찍었던 사진들이 머리에 스쳐간다.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여유는 없는데 꽃을 더 많이 샀던 것 같다. 나이가 드니 점점 필수적인 것만 사고 부수적 것은 아깝다고 잘 사게 되질 않는다. 식탁 위에 있는 장미 한 송이가 시들어 갈 때까지 눈길을 보내며, 가끔은 나를 위해서도 장미 한 송이를 사고 싶다.
https://nyunews.com/culture/2022/02/22/meet-the-rose-guy-by-bob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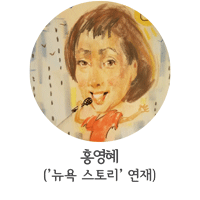
 50 - 자연 한 첩, A Dose of Nature
50 - 자연 한 첩, A Dose of Nature
 48 - 겨울이 봄을 만나는 Wave Hill
48 - 겨울이 봄을 만나는 Wave H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