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에게 쓰는 편지

지금은 기계가 너무 발달되어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 있던 온기와 설렘이 사라진 시대다. 웬만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장례식까지도 모두 문자와 *톡으로 연락이 오가며, 해외에 있는 친지들에게도 일말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기계를 매개로 대강 대강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용건을 말하면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버린다. 기계는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때로는 냉혈한으로 변모시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그것이 아무리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라도 허공에서 메아리가 되어 스러져버리지만 문자는 소멸되지 않는다. 아무리 말로 크게 떠들어도 단정한 글씨로 짤막하게 쓴 편지는 우선 신뢰가 가고 감동을 주며 마음을 따듯하게 한다.
우리가 철부지였을 때를 상기해 보자.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철자법도 틀린 삐뚤삐뚤한 글씨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어머니 편지를 읽고도 반성하지 않는 무쇠 같은 자식은 없을 것이다. 편지는 때로는 전율을, 때로는 편지를 쓴 사람의 보이지 않은 저 너머의 마음까지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
깊은 밤.
불을 밝히고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아서 쓰는 편지야말로 성실한 사람만이 할 수 일이 아닐까? 그런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의 전부가 글에 묻어나기 때문에 많은 위안과 격려를 받는다. 우리가 이런 편지를 생애 중에 몇 통이나 쓸 수 있으며, 또 몇 통이나 받을 수 있었는가가 내 삶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준다. 편지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내용이더라도 일상에 윤활유가 되며,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삶을 다시 재점검해주는 활력소가 된다.
나의 젊은 시절에는 연애편지를 쓰는 것이 유행이었다.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그 시절 젊은이들은 쓰고 또 쓰고, 부치지 못한 편지, 우직하리만큼 쓰고 또 썼다가 태워버린 편지를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부칠 수 없는 편지를 쓴다. 나를 무척 사랑해 준 이모 한 분이 북한에 있는데 지금도 내 가슴을 저리게 한다. 세계 어느 곳이라도 우표만 붙이면 편지가 오고 가는 데 지척에 있는 그곳에는 닿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도 나를 막막하게 한다.
오늘 유난히 어머니의 서투른 철자로 쓴, 나에게 꾸지람을 준 그 편지 한 장이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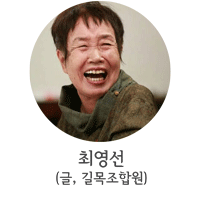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젊은 날의 우리들
젊은 날의 우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