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임종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친정엄마는 내가 큰애를 낳자마자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키워 주셨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레지던트 전공의 일을 하기란 누군가 돌봄 노동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두 아이를 키워 주시고 또 집안 살림도 맡아서 해 주셨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약조차 드시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얼굴이 창백해지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걸, 억지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니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셨다. 3차례 항암치료를 하시던 중 합병증으로 폐렴이 와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자, 병원에서도 다음 항암치료가 어렵겠다고 하여 집으로 모시고 왔다. 그리고 6개월간은 하루 8시간 간병인이 와서 봐주시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밤새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어린애같이 인지기능도 점점 떨어지시다가 마지막 한 달을 거의 의식이 없이 곡기를 끊다시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꺼낸 목적은 엄마가 사시던 집에서 익숙한 엄마 방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엄마는 늘 병원은 싫고 집에서 살다가 저 세상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 살아오는 동안 엄마에게 진 빚을 아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기에. 그러나 이것도 딸이 의사였기에 가능한 것이리라.
아마 누구도 중환자실에서 차가운 기계와 생면부지의 병원 인력의 손길과 기계 소음 속에서 외롭게 임종하기를 원하지 않을 듯하다. 더구나 고통과 무의미한 생명 연장과 막대한 중환자실 의료비용을 감당하여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과거 대가족사회에서는 집안의 누군가 돌보는 인력이 많아 돌아가면서 돌볼 수도 있었고, 집에서 자연스레 임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어린아이들도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죽음을 집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레 죽음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핵가족 시대에 임종을 앞둔 가족들을 전적으로 돌보기가 쉽지 않고, 죽음이라는 과정이 두렵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서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집이 아닌 곳에서 임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곳이나 집에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는 길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집에서 어르신을 돌볼 때, 식사하기, 몸 씻기, 대소변 관리하기 등은 가족들이 할 수 있겠으나, 소변이 안 나온다, 갑자기 설사가 나온다, 호흡이 곤란하다, 아프다고 신음을 내거나, 잠도 안 자고 방안을 배회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고 잠만 자거나, 인지장애가 있어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헛소리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을 맞이할 때,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더 큰일이다. 차편도 그렇고, 돌보는 사람이 동반해야 하고, 복잡한 병원에서 이리저리 검사실로 진료실로 옮기면서 진료받는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다. 만약 이럴 때 의사나 간호사가 왕진을 와서 의료적 처치나 가족들이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준다면 집에서 임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바로 그 고민, 집에서 편안하게 존엄하게 죽음을 맞는 일에 관심을 두고 <죽음학>이라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의대 동기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암 진단을 받고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놓은 환자와 가족이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 돕는 모임도 꾸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뜻을 같이 하는 의사 동료들이 막상 어떻게 이런 모임을 하지 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우선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보자, 그러나 병의원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환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만나보자, 그러면 우리가 3분 진료하면서 단편적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만 하는 의료 관행을 벗어나서, 환자가 살고 있는 가족과 환경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병의원 접근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진료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작년 후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방문진료를 하는 병의원들을 찾아가고, 실제 방문 진료하시는 원장님과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집으로 방문하는 의료진을 따라가서 보고 배우고 하면서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방문진료제도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런 것이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의료보험공단에 방문진료시범사업 실시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해서 시범사업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도 드물고, 한다 해도 병의원 외래 진료를 하면서 하루나 이틀 방문진료 시간을 만들어서 방문진료를 하는 등, 방문진료만 전적으로 하는 의원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수개월간의 논의와 준비 끝에 드디어 방문진료 전문 <서울36의원>이 꾸려졌다. 광화문의 어느 빌딩 5층에 약 10평 정도의 공간을 빌려 올 5월에 개원하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퇴직을 앞둔 의대 동기 의사 4명이 뜻을 모으게 되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요일을 정하여 방문진료를 나가게 되었다.
앞으로 방문진료를 하면서 만나는 여러 일들, 환자들과 가족들, 주위 사람들과 환경과 의료제도들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방문진료의원을 만들게 된 동기와 과정을 알리는 짧은 글이며, 앞으로 나조차도 어떤 만남을 그리게 될지 자못 설레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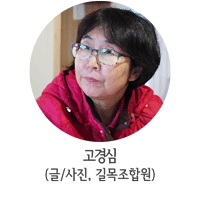
 장애인 주치의로 만난 장애인들
장애인 주치의로 만난 장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