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붓다는 모든 존재가 자신과 똑같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첫 제자인 다섯 명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자, 자신을 포함해 이 세상에 여섯 명의 아라한(성자)이 탄생했다며 기뻐했다. 그 후로도 붓다에게 귀의한 수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고, 붓다의 입멸 후, 불교의 교리와 수행체계는 발전을 거듭하며 '대승불교'라는 거대한 교학 체계를 완성한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화엄사상에서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전제조건마저 떼어버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부처이다"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본다. 참 착한 사람, 조금 착한 사람, 하나도 안 착한데 일은 잘하는 사람, 일머리는 없는데 욕심만 많은 사람, 애정결핍에 시달리며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고마운 사람, 괜히 좋은 사람, 이유 없이 미운 사람, 같이 밥도 먹기 싫은 사람... 온갖 양상의 인간들이 지천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나 또한 작은 것에 욕심내고,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고, 조삼모사에 횡재했다며 좋아하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가, 당신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처인가?
붓다의 답은 2천6백여 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다'이다.
붓다가 당시 국제적 상업도시로 유명했던 인도 웨살리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많은 백성들에게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던 시하(Sīha)라는 유명한 장군이 하루는 붓다를 찾아갔다. 신심 깊은 자이나교의 신자로서 자신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는 붓다를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신들의 믿음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으리라.
그런데 붓다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시하 장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 오던 문제의 답을 얻고 붓다가 설하는 진리에 눈을 뜬다. 그리고 스스로도 놀라며 "붓다에게 귀의하겠다"라고 말한다. 다른 종교지도자들은 서로 자신을 제자로 받고 싶어 했으니, 붓다도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면서.
하지만 붓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대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숙고하여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만류한 것이다. 당황한 시하 장군이 거듭 제자로 받아 줄 것을 청하자, 붓다는 지금까지처럼 자이나교 수행자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하 장군을 제자로 맞이했다.
이처럼 붓다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헤게모니를 다투지 않았다. 논쟁을 청하는 이는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타파했고 무력을 앞세워 공격하는 이들은 자비심으로 품어 안았다. 자신의 목표가 오직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 행복으로 이끄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악한 스승에게 속아 100개의 손가락을 모으기 위해 99명의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해하려던 앙굴리말라를 교화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촌동생 데바닷다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을 맞았다. 그 사이 나라는 극심한 분열로 치달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체 또는 퇴보의 시기를 겪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세 번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고 두 번의 탄핵이 현실이 되었으니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그럼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딜지언정 꾸준히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라 여길 수밖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의 치열했던 반목과 상처를 근본부터 치유하고 더 이상은 후안무치한 독재자가 내 가족, 내 이웃, 우리의 후손들을 위협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모두가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그리고 이 순간 가장 절실한 것이 붓다의 자비사상이 아닐까 한다.
나도, 당신도, 세상 '똥멍충이' 같아 보이는 이들도 모두가 부처라는 붓다의 가르침, 교화시키고 개심시켜서 어딘가 뜯어고치고 바꿀 필요도 없이 지금 모습 그대로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한 송이 연꽃이라는 화엄의 사상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본다.... 고 하지만 불자로 살아온 지 반세기, 불교를 전공하고 작가로 밥 먹고 산 지 30년, 여전히 알 것 같다가도 모르니 이 중생은 여전히 갈 길이 까마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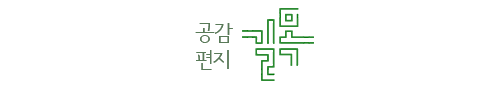
 탈권위주의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
탈권위주의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