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일상
지난 호에는 ‘향기로운 일상’을 갈구하며 그래도 듣기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호에는 ‘무너진 일상’들이 내 가슴에 밀어닥쳐 어쩔 수 없이 황량한 마음으로 펜을 잡는다. 하지만 이 두 다른 색깔의 제목은 본질적으로 같은 주제임을 필자가 깨닫듯이 독자들도 그리 알게 되리라 믿는다.
4월은 화사하게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간다.
그래도 꽃이 사라진 자리에 푸릇푸릇 초록빛이 돋아나면 왠지
허무에서 희망으로 마음은 위로와 생기를 얻게 된다.
우리 모두 4월의 핏자국을 씻고, 어두운 심연에서 올라와 어김없는
봄 햇살에 마음이 녹아들면 좋겠다.
날마다 뉴스에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뜨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끊이지 않고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다. 금년에 5주기를 기해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이 쓴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이 출판사 창작과비평사에서 출판되었다. 평소에 나는 그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하고 때때로 과일이나 빵, 과자 등을 사들고 광화문에 방문할 때면 가족들과 만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노랑 리본을 만들고 있는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이젠 그 광화문 천막들이 철거되었다. 나는 다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아쉬워하면서 무언가 찾고 있다가 마침 출간된 그 책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389쪽)를 등기 속달로 받게 되어 고마웠다. 내게는 반갑고도 무거운 책이었다. 마음의 빚도 무겁게 느껴졌다.
우선 그 책을 읽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방식의 빚 갚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다. 오늘 필자가 쓰는 이 글 속에 그 공감이 묻어 나오는 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바람이기도 하다.
* * *
일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낯설게 된다. 익숙함의 자리에 고통과 후회가 들어오고 낯선 삶이 침략자처럼 자리 잡는다. 그런데 일상이 무너진 사람은 그 폐허 속에서 본능적으로 희망의 잔재라도 붙잡아보려고 애쓴다.
일상이 무너지면 꿈도 깨진다. 꿈이 깨지면 행복이 안주 할 자리가 없다. 행복은 어쩌면 작은 꿈 밭에서 싹 틔우는 것이 아닐까?
있던 가족이 갑자기 없어져서 3식구가 살다가 한 아이가 없어지니 둘이만 남는 것이 낯선 삶이다. 둘이 살다가 하나가 떠나면 혼자 남으니 그 빈자리가 크고도 낯설다. 온전하던 몸이 갑자기 자기 몸이 아닌 낯선 사람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무너져버린 일상과 싸우며 버티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덧 서서히 그 낯설음에 적응하거나 체념하며 익숙해져 가는 자신들이 오히려 낯설어 지기도 한다. 이게 나인가? 지금 내가 누구지? 여전히 누구의 엄마인가? 아빠인가? 아직도 떠난 그 사람의 아내인가? 떠난 그녀의 남편인가? 그때 그 내가 아닌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일상이 무너진 우리 이웃, 가족, 친지들을 어떻게 쳐다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누구로 다가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고 싶은 큰 질문이다.
* * *
앞에 소개한 책 속의 글(엄기호, 우린, 아직 동시대인이 아니다)에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정의를 인용하여 동시대인이란
“자신의 시대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어둠을 지각하는 자”라고 설명한다. 즉 그 사회가 감추고 있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자가 동시대인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태일은 70년대의 첫 번째 동시대인이었다. 그는 그 시대의 어둠을 꿰뚫어 보았다. 이 저자는 전태일의 잘 알려진 말도 소개했다. 즉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 한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다.
이 얼마나 작고도 간절했던 소원인가!
그 노동자 청년은 대학생 친구 하나가 절실히 필요했다. 누군가 그의
대학생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었다면, 누군가 동시대인으로 그 사회의 암흑을 그와 함께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면 그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일상은 무너지다 못해 끝나고 말았다. 그의 희생이 암울한 이 사회에 빛을 던져 주었지만.
<나의 이야기 한 토막>
전태일의 일상과 비교가 안 되나 내 개인적인 일상이 무너져 가고 있던 어느 날이 기억난다. 어느덧 팔구년이 흘렀다. 남편 홍근수 목사가 알 수 없는 병의 진행으로 갑자기 목을 시술하게 되어 교우가 운영하는 인천의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미국에 있던 나는 받자마자 충격 속에 귀국하였다. 일단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에 들려 준비해서 병원으로 갈 참이었다. 장기입원이 예상되었기에. 그 아파트는 충정로 언덕위 바로 안산 옆에 위치하고 거실에서 인왕산이 내다보이는 작고 예쁜 집이었다. 남편이 날마다 산책이 필요해서 내 자신이 심혈을 기우려 찾아 낸 집이었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 중요한 볼일로 가 있는 동안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우리 동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파트 호수도 알고 문 여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구하러 다닐 때 한번 잠간 보았고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낯선 집이다. 게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고 남편마저 떠나버린 빈집, 그 집이 내 집인가 싶고 들어가기가 무서웠다. 남편이 잠시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면 그리 무섭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가 영영 다시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슬픈 마음이 나를 엄습하여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누군가 친구라도 있어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한참 생각하다가 내 사정을 잘 아는 교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미국에서 방금 도착했는데 왠지 무서워서 집엘 못 들어가겠는데 와서 나와 함께 잠깐 같이 들어 가 줄 수 있을까요?’그 친구 집은 멀고 당장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나는 한참을 거기 어둠속에 서서 생각하다가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걸고 똑 같은 사정을 말했다. 그 친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너무 급작이라 이해는 했다. 더 이상 전화를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주저되어 마냥 슬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남의 집 문을 열듯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 들어 갈 수도 없어 조심조심 어둠 속을 더듬어 들어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날 밤 그 ‘내집’은 너무나 낯설고 나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왔다.
동시대 사람 하나 못 찾은 전태일, 동네 친구 하나 못 찾은 내 자신!
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나의 어두웠던 그때 그 장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의 반지에 새겨있는 기도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용기를,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인홀드 니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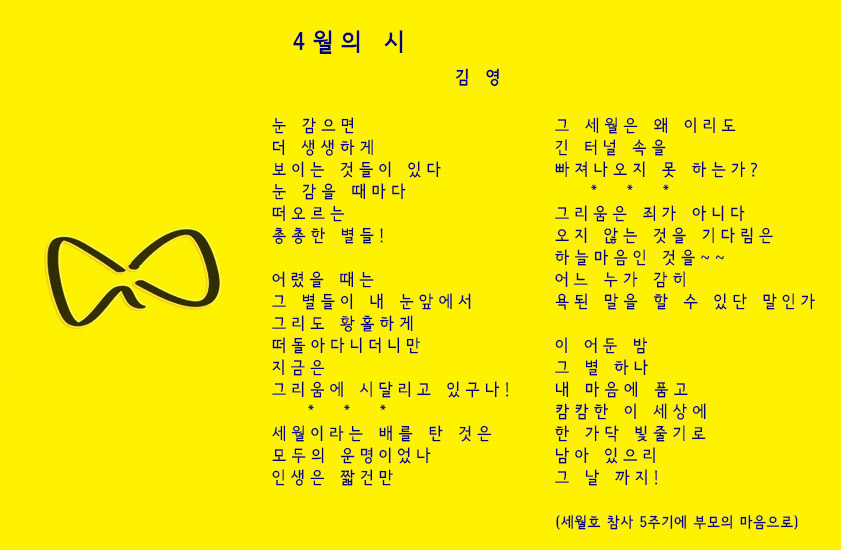


 영언니의 깨는 일상 5 - 5월의 민들레
영언니의 깨는 일상 5 - 5월의 민들레
 영언니의 깨는 일상 3 - 향기로운 일상
영언니의 깨는 일상 3 - 향기로운 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