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댁 단풍편지 7 - 새로운 관계의 그물망에 걸리다
귀촌했다고 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상상하며 TV에 나오는 ‘자연인’을 연상하면서, 공기 좋은 자연에서 텃밭 가꾸며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부러워한다. 나는 주위에서 규정하는 정체성의 그물망 - 직업, 나이, 성별, 여러 단체에서 맡은 직분들, 가족관계 등등 - 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유롭게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정읍으로 내려왔다.
“셋째 종수? 안 본 얼굴인디!”
작년 이맘때 기둥만 남기고 다시 짓다시피 하는 시골집 공사 중에 누가 이사 오느냐고 궁금해서 묻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다. 이 동네에는 남편의 조부모님께서 사실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 집안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사신다. 그 분들은 여름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내려온 손자손녀들을 보아 오셨으며 심지어 큰 시누이와 큰 시아주버니는 한국전쟁 때는 피난 와서 잠깐 살기도 했단다. 남편의 형님 두 분은 내려와서 산에 나무하러 가기도 했으며 주위에 같이 놀던 친구들도 아직 동네에 계신다. 그런데 남편 ‘종수’는 어리기도 했지만 방학 때 자주 시골에 놀러오지 않았었나보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남편은 익숙하게 보던 얼굴이 아닌 것이다.
시골집은 동네 초입 삼거리 사람들 왕래가 잦은 위치에 있어 오가며 집 안 마당이 잘 보인다. 새집 구경하러 왔다며 오가며 동네 어르신들이 불쑥 들어오신다. 차 한 잔 하시라고 자리를 마련하면 이 집에 얽힌 추억과 내력을 말씀하신다. 이 집 할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할머니는 매우 엄하시고 독하신 분으로 살림을 지켜내신 분이시고 남편의 할아버지는 한량으로 풍류를 즐기시며 사셨다는 얘기와 함께. 이 집을 거쳐 간 여러 사람들의 삶의 추억담을 풀어내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골집과 동네 분들과 보낸 세월의 그물망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또 동네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같은 부안 김씨, 또는 할머니 외가인 광산 김씨, 또는 시어머니 쪽 안동 권씨 등등 족보에 기인한 성씨와 가족관계의 내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게다가 항렬이 어떻게 되니 삼촌뻘이라는 둥, 조카뻘이라는 둥 서열 규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당숙이니 처조카니 하면서 가족관계를 호칭하는 아주 어려운(?) 명칭들 속에서 나는 가족관계 명칭을 새롭게 학습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번은 동네 마을회관이자 어르신들이 쉬는,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는 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곳에 들러보았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인사를 하자, 나를 옥박골댁 셋째 며느리라고 알아보신다. ‘옥박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나는 어리둥절했다. 옥박골은 시어머님이 사시다 오신 곳의 지명이라 시어머님은 옥박골댁이라고 불리며, 나는 그 집의 셋째 며느리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골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덕안댁, 김포댁, 논산댁이라고 여성이 살다가 온 지명을 따서 명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그렇게 호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또래인 1958년이나 1957년 여성들도 그렇게 서로 부르고 불리고 있었다. 어느새 나는 서울에서 왔다고 서울댁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서울댁이자 셋째 며느리’라는 지역 출신과 가족 관계망의 위치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에서 도시의 익명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 시골은 아직도 전통사회 가족 관계의 끈끈한 그물망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다.
“사는 곳이 다르면 삶이 달라질까?” 하는 물음과 기대를 가지고 시골에 내려왔지만 여기서의 삶 역시 가족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규정 되는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새로운 나의 정체성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자유롭게 새롭게’ 기대했던 시골생활을 들여다보니 ‘자유롭게’는 아니고 ‘새롭게’는 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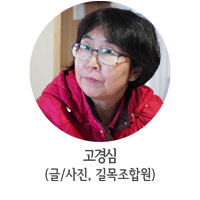
 정읍댁 단풍편지 8 - 정읍에서 본 농촌 현실
정읍댁 단풍편지 8 - 정읍에서 본 농촌 현실
 정읍댁 단풍편지 6 - 한 여름 땡볕의 풍성한 수확
정읍댁 단풍편지 6 - 한 여름 땡볕의 풍성한 수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