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무늬인 종교성에 대한 성찰 18 : 신의 함성 (Divine Cry)
얼마 전 우리 교회의 ‘철공소’(철학을 공부하는 소모임)라는 모임에 초대되었다. ‘과정신학’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난해하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인 신학대학에서조차 잘 다루지 않는 사상에 대한 이들의 관심이 놀라웠다. 그 날의 열띤 시간 후 난 과정신학을 보다 널리 알릴 필요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과정신학의 관점은 보다 진지한 종교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상적 무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부터 써온 길목인 칼럼도 이 주제와 무관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과정신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과정신학은 종교적 사유가 교리적 독백이 되지 않도록 보편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철학적 신학이다. 사상사적으로 보면 종교와 과학이 서로 조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체계를 만들려는 기획이라고 하겠고, 기독교 내부적으로 보면 과학과의 대화에서 실패한 19세기 이후 잃어버린 ‘자연신학’의 전통을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과정신학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전통과도 사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일반 토대를 마련하는데 관심한다.
과정신학의 공헌 가운데 하나는 신(神)에 관한 사유방식의 변경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이 신을 질서의 수호자나 심판자로 그려낸 반면, 과정신학은 창조적 변혁을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한다. 심판자로서의 신의 이미지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서 ‘기성질서’(Status Quo)를 중시하는 종교가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신학적인 체계는 스콜라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정초되었다고 하겠다.
아퀴나스는 신을 가리켜 ‘단순한’(simple) 존재라고 했다.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에게는 잠재태(potentiality)와 현실태(actuality)가 항상 같기 때문에 그 존재 구조가 단순하다고 봤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다. 인간은 신처럼 전지(全知)하지 않아서 아는 것이 변하고, 선(善)하지 않아서 반드시 선을 따르지 않으며, 전능(全能)하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모두 할 수 없다. 인간사가 복잡한 이유는 그 잠재태와 현실태가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신의 ‘단순성’이라는 아퀴나스의 개념은 신학적 사유를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추상적’ 본질에 관한 논리적 추론에서 본 효과였을 뿐, 신과 세계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 적용했을 때에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 예를 들어, 신의 단순성이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형성된 근대적 관념들 - 갈수록 비웃음을 사고 말았던 사고방식들 - 즉, 칼빈주의적 예정설, 17/8세기의 유신론적 기계론과 과학적 환원주의, 19세기 진화론에 패배한 기독교 자연신학, 20세기 근본주의 신학의 창조과학 이론 등은 모두 현실세계가 신의 잠재태에서 비롯된다고 추론하는 이론들이었다. 이 이론들은 모두 사물의 본질과 그 운동에 관한 논쟁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전통신학이 오늘날 맥을 못 추는 -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축복이라는 종교의 비본질적인 유혹을 앞세우는 -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유체계가 신의 ‘단순성’(simplicity)이라는 관념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체적’ 현실세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추상적’ 신의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구체와 추상을 혼동하는 것을 가리켜,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잘못 놓여 진 구체성의 오류’(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 과정신학의 기초를 놓은 찰스 하트숀은 신의 추상적 측면만이 아니라 구체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다고 봤다. 그는 신의 추상적 본질이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신의 완전성이라면, 세상과의 신의 구체적 관계는 변화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 세계에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면 그것은 신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결국 신의 구체적인 상태는 가변적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점에 있어서 과정신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화이트헤드는 다르게 기술한다. 그는 신이 두 가지 본성 즉, 시원적(primordial) 본성과 연관적(consequent) 본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시원적 본성은 세계에 창조적 영향을 주는 신의 초월적 특징이요, 연관적 본성은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신의 내재적 특징이다. 두 사람의 묘사는 조금 다르지만 핵심주장은 같다. 그들은 모두 신의 추상적 측면만을 다룬 전통신학과는 다르게, 신의 구체적 측면 즉, 신과 세계의 관계성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과정신학이 전통신학의 눈에 껄끄럽게 보이는 이유는 신의 ‘구체적’ 측면 또는 ‘연관적 본성’에서 비롯된 신의 가변성(changeability)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철학자 사무엘 알렉산더가 미리 말했듯이 신성(deity)도 우주적 시공간 속에서 진화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신이 변화를 겪는다는 생각은 전통신학의 논리로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무한한(infinite) 신은 완전하고(perfect), 완전한 신은 불변(immutable)하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만일 변화하는 신이 있다면 그는 완전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과정신학에 따르면 살아있는 구체적인 신이라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 만일 신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창조란 있을 수 없고,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의미를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고아와 과부들의 탄식이 야훼를 움직이듯이 세계와 교감하는 신은 변화한다고 보는 과정신학의 주장은 옳다. 과정신학의 사유방식에서 신의 무한성은 변화를 포용하며, 신의 완전함이란 불변성을 가리키지 않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신의 사랑(Divine Eros)을 의미한다. 완전한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사랑에서 우주의 모든 새로움이 창조된다.
이 신의 창조는 비통의 기억 하나 없는 천진난만한 창조가 아니요, 고난의 흔적 하나 없는 절대 힘의 자기표출이 아니다. 과정신학의 신은 탄식하는 이들의 ‘동반자’(fellow-sufferer)요, 절망하는 세계를 부르짖으며 깨우는 우주적 시인(Poet)이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창조는 이 시인의 부르짖음(cry)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그것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자신의 지적 여행을 그린 소설에서 말한 ‘거대한 호흡’(gigantic breath) 또는 ‘위대한 함성’(great cry)이다. 거기에서 생명의 모든 도약이 일어난다.
“하늘과 땅을 휩쓸며 불어오는 거대한 호흡,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함성,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신이라고 말한다.”(Report to Greco,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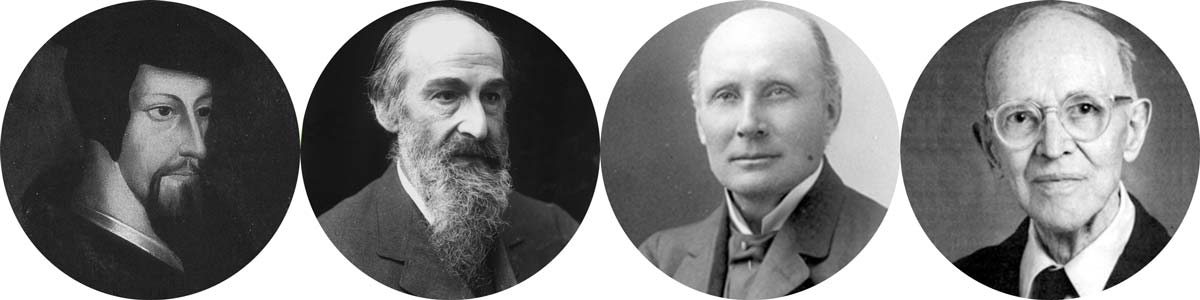

 김희헌 인문(人紋)의 종교 19 - 창조와 아가페
김희헌 인문(人紋)의 종교 19 - 창조와 아가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