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동에 있는 시골집은 남편의 시가다. 시아버님께서 서울에서 건설사업을 하시면서 조부모님 거처로 마당 넓고 텃밭 있는 집과 집 앞에 말 그대로 문전옥답을 마련하셨다. 조부모님이 사시다가 시아버님께서 60세 중반에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사셨다. 내가 시집와서는 시어머님께서 가을이면 홍시감과 문전옥답에서 나온 햅쌀을 보내주시곤 하였고, 성묘할 때는 시집 형제들과 하룻밤 자고 가곤 했다. 앞마당 네 그루 감나무에서 홍시감과 단감이 튼실하게 익었고 뒷마당도 무화과나무도 우거지고 호박이 덩굴째 굴러다니던 곳이었다. 시어머님께서 기력이 떨어지셔서 서울서 내려온 시누이와 함께 정읍시내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시고 나서는 거의 십 년째 돌보는 이가 없어 폐가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아흔 연세에 돌아가시고 시누이까지 뒤늦게 발견된 말기 폐암으로 6개월 투병하다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 빈 시골집을 어찌할까 시가 형제들이 의논하는 중, 셋째 며느리인 내가 시골에 살아보겠다고 나섰는데 모두들 반기는 형국이었다. 다들 자기가 사는 일터와 삶터를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나는 60세가 되자, 하던 일을 접고 은퇴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의 내용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작정 자원하고만 것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과연 잘한 일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2017년 5월에 가 본 시골집은 가관이었다. 앞마당 감나무, 소나무, 석류나무와 어른 키만 하게 자란 잡초와 거미줄을 뚫고 겨우 마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뒷마당도 은행나무, 무화과, 드릅나무, 모과나무 등과 잡초와 날벌레 곤충들이 사이로 정글 숲을 헤쳐 가는 기분이었다. 본채와 행랑채로 이루어진 두 채의 집은 다행히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붕은 석면 판넬이고 나무기둥 썩은 곳이 여러 개 보이고 집안 살림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오래된 냉장고, tv, 옷장, 부엌살림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보고나니 한숨이 나오고 내가 왜 여기서 살겠다고 했는지 바로 후회막심이었다.
그래서 어찌 집을 지을까 집 지어본 분, 건축업자, 건축 전공 동생 등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다. 집을 다 허물고 새로 현대식 집을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의 기둥과 공간을 살리고 벽과 지붕 단열 처리하고 바닥에 보일러를 까는 리모델링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용을 산출해본 결과 허물고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저렴하였고, 당연히 비용효과측면에서 저렴한 쪽을 선택하였다. 정읍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분(지금부터 한사장이라 부르겠다)은 정읍 출신 정읍 건축업자인데 황토벽돌공장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이분은 시골집을 리모델링한 경험과 한옥을 지은 경험이 있고 또 시골집을 와서 보고 제시한 건축비용도 높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기대한 것은 아주 소박했다. 그저 들어가 살 정도면 된다고. 그리고 가끔 손님들이 놀러오면 행랑채에 묵을 만하면 된다고.
자, 이제부터 집 지으면서 내가 느낀, 아니 당한, 서프라이즈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먼저 2017년 8월말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도 정했다. 계약금은 바로, 중도금은 지붕 기와 얹고 나서, 잔금은 준공 후로, 건축기일도 11월말로 넉넉하게 잡았다. 나도 2017년 말까지 파주병원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기로 해서 보름 또는 3 주 간격으로 정읍에 내려 갈 수밖에 없었고 갈 때마다 놀람의 연속이었다.
첫 번 째 서프라이즈. 한사장이 전화를 해서 마당의 나무를 어찌하겠냐 하여 뒷마당 은행나무는 너무 높고 커서 베고 앞마당 감나무 네 그루, 석류나무, 소나무는 살려두라고 하였다. 그런데 가보니 웬걸, 모든 나무를 베어버리고 앞마당 소나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내 살점 하나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 크고 맛있는 홍시 감을 맛볼 수 없다니! 한사장에게 따졌더니, 그랬나요? 하면서 감나무가 늙어서 베어야 한다고 태연하게 답하는 것이다. (이 감나무를 모두 베어낸 것에 대해서는 시집 형제들도 성토한다.)
두 번째 서프라이즈. 한사장이 전화를 해서 처음 제시한 건축 도면을 바꾸어야겠다며 도저히 화장실과 샤워실 면적이 안 나와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짓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전화로 주먹구구로 도면을 바꾸고 눈대중 어림짐작으로 하는 게 맞나? 업자가 그렇다니 그렇게 하라고 할밖에. 도면에 있던, 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바로 부엌으로 가져올 수 있게 부엌에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도 없어지고 채소의 흙을 털 수 있게 수도가 있는 준비실 공간도 없어졌다. 더구나 원래 있던 툇마루(옛날 시골집 툇마루에 앉으면 흙담 너머로 저수지와 나지막한 앞산 풍경이 보여 참 좋았는데)도 없어지고 집 앞 나무 데크로 대체되었다.
애초 내가 그리던 집의 모습과 한사장이 직접 지은 집의 모습은 차이가 컸다. 이때부터 미련을 버리고 점점 포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 남들은 집 짓느라고 십년은 늙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장에 와서 보지도 않고 알아서 잘 해주기만 바라니, 업자가 하는 대로 믿고 맡기는 수밖에.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동네사람들이 보기에 튀지 않게 시골 수준에 맞게 소박하게 지어야한다고 좋다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문과 남편이지만 너무 했다. 남들은 남편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한다는데 이 사람은 천하태평이다.)
세 번째 서프라이즈. 석면 지붕을 제거하고 기와를 얹었다고 해서 중도금을 보내고 가보았다. 애초에 전통기와는 너무 무거워서 안 되고 가볍지만 튼튼하다고 하는 강화기와로 바꾼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막새기와에 무궁화 문양이 하얗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었다. 아니, 독립기념관도 아닌데 무궁화 문양? 이거 왜 물어보지 않았냐, 무늬 없는 게 좋다고 했더니, 시골에는 이 문양으로 다 한다고 한다. 새 기와 얹은 동네 다른 집도 죄다 무궁화 문양이다.
네 번째 서프라이즈. 한사장이 카톡으로 대문이 완성되었다고 사진을 올렸다.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로 만든 문이라니! 이 문은 한사장이 직접 만들었고 나름 페인트까지 정성들여 칠해서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럼 페인트 색을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냥 나무색이 좋은데. 이제 포기를 점점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가서 보니, 응, 초록색도 괜찮네 하면서 정신승리 수련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다섯 번째 서프라이즈. 비싸도 환경을 위하고 열효율 좋다는 경O 콘덴싱 보일러를 본채와 행랑채에 설치했다. 공기가 늦어졌지만 우리는 급할 거 없고 괜찮다고 해서 12월말에 가서 보일러를 작동시켜보았다. 화장실과 샤워실 바닥에 보일러를 깔았다고 하는데 반쪽만 미지근해서 온기가 없다. 게다가 행랑채는 화장실에 바닥 보일러도 깔지 않았고 벽에 단열처리나 황토벽돌을 보강하지 않고 옛집 그대로인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 화장실 바닥 보일러 깔았냐고 확인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추가 보일러 공사와 벽 단열공사를 1월에 하게 된 것이다. (그 때 일주일간 폭설로 막상 공사하는 것도 못 보고 혼자 갇혀 지낸 얘기는 1월 단풍편지에 쓴 바 있다.)
이 외에도 맘에 안 드는 문제가 많았다. 천장이 너무 낮아 키 큰 사람은 머리 부딪힐 것 같고, 현관 바닥이 기울어져 미끄럼방지 테이프 사다가 붙이고, 화장실 문이 비뚤어져 천장과 문 사이가 비스듬하게 보이고, 창문도 하라는 대로 안하고 그냥 해버리고, 바닥 장판이 울어서 바닥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펴주고,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추가 콘센트 만들어 붙이니 보기가 싫고, 부엌 벽타일은 회색 모자이크 무늬가 알록달록 어지러운 타일로 붙여버리고(아, 정말 흰색 타일로 바꾸고 싶다!) 등등. 0.000001 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달나라 로켓 쏘는 것도 아닌데 몇 십 센티 오차 정도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 괜찮다며 인내심을 시험하는 순간이 많았다.
지금까지 서프라이즈를 당하면서 정신수련한 얘기만 했으니, 좋은 점도 한두 가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초에 집짓기 전에는 황토방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한사장이 참고하라고 짓고 있는 집을 보여주었는데 장작불 구들이 있는 황토방이 있었다. 이걸 보고 남편이 눈을 반짝거리면 우리도 이거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제안한 것이다!) 유독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황토방을 보니 반가운 모양이었다. 나는 속으로 장작은 누가 패고 불은 누가 때나? 하면서 매우 회의적이었다. 다른 건 나 몰라라 하던 남편이 장작불 땔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성껏 불을 살피니, 저녁이 되자 황토방 바닥이 손을 댈 수 없도록 뜨끈한 게 드러누우니 온몸의 피로가 가시면서 노곤해지는 것이었다. 단연코 시골집의 백미다. (불 때는 수고로움만 빼면).
또 좋은 점은 기와지붕 처마가 집 주위로 빙 둘러쳐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 집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점이다. 황토방 구들을 땔 때 비나 눈 맞지 않고 처마 밑을 돌아서 뒷마당으로 갈 수 있는 게 새삼 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하얀 눈이 내려앉은 앞마당 소나무를 보니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그림이 눈앞에 있는 듯 그 정취 또한 괜찮았다. 처음 보았던 귀곡산장 같던 폐가에서 이만큼이나마 몸담고 잠 잘 수 있게 되니 그 또한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사연이 많지만, 믿고 맡겨 건성건성 편하게 집을 지은 것도 흔한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아무튼 정읍 건축업자 한사장은 나름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며, 평생 A/S 해준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을 믿어보자 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P.S. 앞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께 경험 상 충고. 우리처럼 하면 안 되고 꼼꼼히 지켜보세요. 그래도 맘에 안 드는 게 많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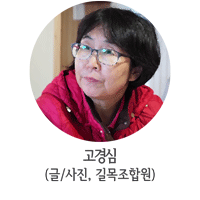
 정읍댁 단풍편지 3 - 시골이 왜 좋으냐고?
정읍댁 단풍편지 3 - 시골이 왜 좋으냐고?
 정읍댁 단풍편지 1 - 눈 속에 갇힌 4박 5일
정읍댁 단풍편지 1 - 눈 속에 갇힌 4박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