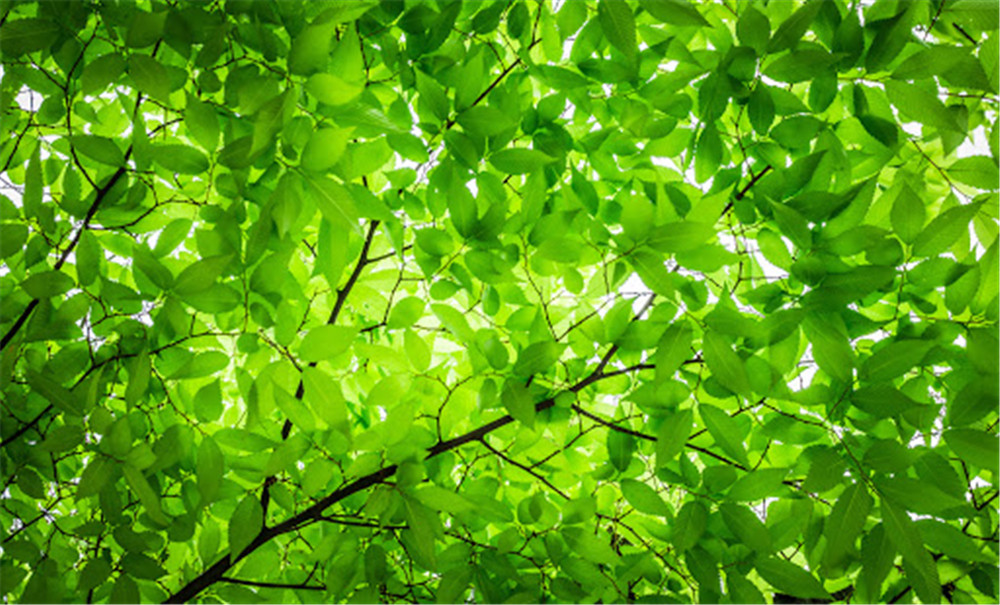
이 산 저 산, 연둣빛이 가시고 온통 초록초록으로 물들어가는 푸른 달 5월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정도로 코로나19의 위협이 완화된 지금, 지난 2년 남짓의 삶을 돌아봅니다. 팬데믹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삶의 표준(New Normal)에 적응하여 변화하고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다짐이 무색합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요한복음 21:5) 밤새워 매달렸으나 여전히 텅 빈 그물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 제 헛헛한 마음이 초라하게 겹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여기 사람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번집니다. 경기 사이클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금리는 주욱주욱 올라갑니다. 어설픈 기대조차 안 생기는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갈팡질팡 쏟아내는 온갖 잡음들 사이에서 자산 디플레이션 신호는 갈수록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힘든데 더욱 팍팍해질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그동안 우리 길목이 주목해 온 피멍 든 언저리의 삶 들과의 연대가 앞으로 더욱 각별해 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교차합니다.
문득 일터 동료 책상 한 켠에 자리한 장난감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린이날 선물이 점심시간 화제로 잠시 떠오릅니다. 장난감은 어린 시절 놀이에 대한 추억으로 이어지고, 어느새 공부, 노동, 살림살이, 협동조합, 목적, 예배, 정치, 돈, 회의, 성과와 같은 진지한 언어들에 포획되어 무겁게 가라앉은 오늘의 나의 얼굴을 어린 시절의 내가 서글픈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진지한 언어는 화단에 심긴 연약한 나무 이파리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하지요. 진지함을 포섭할 줄 아는 놀이의 능력에 의탁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삶을 제대로 즐기고 놀기 위해서라고 춤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음을 왜 잊고 살았을까?
2022년 5월에 이상 시인의 말을 빌려 이렇게 외치고 싶어지네요. “놀자. 놀자. 한번만 더 놀자꾸나.”


 새로 시작하는 4월
새로 시작하는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