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쩌다 어른이 되었다. 내 무거운 자아는 많은 동시대인이 그렇듯 시대적 아픔이 큰 몫을 차지한다. 대학생이 되면 날개가 돋아 한껏 자유로울 줄 기대하며 제복과 규율의 통제를 견딘 한 고등학생, 그가 진입한 대학이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독재에 맞서 행동하라는 요구가 청교도적 강제로 기다리고 있었다. 내 존재의 날개는 강한 ‘우리’ 앞에서 부르주아의 실존놀음으로 치부되고 또다시 지연되었다. 학생회에서 향락적, 소비적이란 이유로 거부한 축제처럼, 개인차원에서는 낭만과 놀이, 심지어 웃음까지도 거부해야 할 듯한 무거운 분위기는 어느새 내가 되었다. ‘~ 해야한다’는 윤리적 사고는 졸업 후 어찌어찌 시작하게 된 회사생활의 상명하달식 문화와 결합해 교묘히 내 안에서 진화한 듯하다.
무지했고, 그래서 더욱 외면했던 내 안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가정으로 돌아와서였다. 출산, 양육, 재정의 책임이 막중했던 나의 조건에서 일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과 진정한 시간을 가질 힘은 늘 남아있지 않았다. 퇴직하고서 내가 방전되었음을 채 알지 못하고, 갓난이 때부터 남의 손에 길러진 두 딸과 어색한 마주봄을 시작한다. 결혼 후 10여 년이 흘러간 그때까지 결혼 후의 아내, 출산 후의 엄마라는 부가된 역할에 대해 내겐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가정에 머무르는 짧은 시간은 과장해서 회사 일을 위한 잠시의 휴식일 뿐이었기에 그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늦게 시작한 아내와 엄마 역할 - 40중반의 나이에 시작한 기계체조 같을까?! 악전고투.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큰 딸은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수학문제를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말귀의 사람이 있다니!?” 성탄선물로 원한다는 “행복한 우리집”이라 쓰인 쪽지를 보고, 형이상학적 수준에 감탄하고 좋아하다가, 정작 그것이 의미하는 장난감세트 선물을 놓칠 뻔도 하였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우왕좌왕하는 내게 큰 아이는 늘 내 직장동료 수준으로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학습능력도 뛰어난 성인이어야 했다. 힘들었을 큰 아이에게 사과한다.
남편. 모든 것이 규범을 전제로 성과예측에 따라 움직이는 내게 감정적 인간의 습격이란?!!! ‘이 조건에서 ~이 최선이다’는 지시적 판단이 늘 작동하는 사고형에게 ‘내 기분’이 상했다의 감정수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그의 대응은 충격적인 외계인 방식이었다. 그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누그러지지 않았던 세월들. 그와 비례해 깊어갔단 나의 좌절감. ‘나’라고 믿어왔던 내 생각과 행동, 그 존재감의 유지가 가까운 가족과의 소통능력과 긴밀함을 그제서야 깨닫는다. 그리고 따뜻한 감정적 포용이 사람됨의 가장 큰 부분이란 단순한 진리도. 나의 부족함을 견뎌준 가족에게 감사한다.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둘째 아이와의 화해가 남았다. 그를 위해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아야겠다. 더 깊이, 더 오랜 동안 외면해왔던 내 속의 아이를 기꺼이 안아줄 수 있을 때 엄마로서 받은 상처만 부여잡고 있지 않고 딸아이가 가진 외로움과 화를 이해할 수 있을테니. 나의 견고한 성을 하나하나 해체시키고 마침내 상대를 인정하는 백기를 드는 순간. 그것이 너와 나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승리의 깃발이 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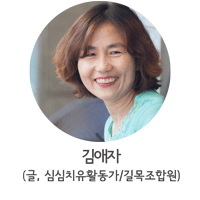
 내 안의 다른 목소리와 만나기
내 안의 다른 목소리와 만나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여정, 상담 이야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여정, 상담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