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본 농촌 현실 - 생존 피라미드의 바닥을 받쳐주는 농사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제일 낮은 지방이 전라북도이다. 정읍시는 11만 인구의 전라북도 소도시이며 농업과 축산업이 주산업이다. 관광업은 내장산 단풍철에만 반짝 특수를 누린다. 내가 사는 고부면 만수리도 방앗간, 정미소, 미장원, 약국, 동네 구멍가게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고 가구 수도 100 가구에서 40 여 가구로 줄었다. 10 여 개월 동네 사람들과 오가며 지내게 되면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1958년 생 돼지띠 김포댁은 400여 평 땅콩 밭과 시동생이 사둔 1,500 평 농장에서 밭농사를 한다. 나도 한번 거들어본다고, 땅콩 줄기를 뽑아 세워 말리고 채에 쳐서 땅콩만 분리하는 작업을 2 시간 같이 해보았는데 흙먼지 뒤집어쓰고 팔과 전신이 꽤 아파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김포댁은 거둔 땅콩을 수레에 실어 집 마당에 널어 말린 후 흙과 가라지를 골라낸다. 이렇게 공을 들여 봄부터 모를 심고 가을에 수확하여 거둔 땅콩을 도매상이 가져가는 가격은 2백만 원이 못 된다. 일 년 농사가 한 달 월급만도 못한데 그나마 들어간 인건비, 퇴비, 농약 가격과 노력을 생각하면 도무지 산술적으로 남는 셈이 아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익숙한 땅콩 농사를 다시 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땅콩 거둔 밭에 양파, 마늘 심어 겨울 농사를 이어간다고 한다.
앞집 정안댁 할머니의 집 앞 60여 평 밭은 할머니의 놀이터이자 그림책이다. 밭 가장자리는 구절초, 분꽃, 국화, 돼지감자, 우슬초 등으로 구획을 짓고 그 안에 상추, 부추, 생강, 고추, 무, 배추 등등이 돌아가며 심거나 거두거나 하여 나날이 작물이 바뀌어 변화무쌍하다. 새벽 어스름부터 할머니 밭 호미 소리가 들리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신다. 우리 집에 손님 온다고 하면 상추나 양파를 주시고 고추나 가지 등을 따가라고 하신다. 내년에는 국화 옮겨서 우리 꽃밭에 심으라고 하시고 뭔가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신다.
아랫집 덕안댁 할머니도 청주에서 횟집을 하는 아들한테 줄 식재료를 대시느라 늘 분주하다. 양파, 고추, 들깨, 참깨, 마늘, 토란, 도라지 등등. 이제 김장거리로 배추, 무, 파 등을 심으셨다. 나에게도 내년에 심어보라고 도라지 열매를 말려 씨를 거두어서 한 웅큼 주셨다. 도라지 씨를 처음 보았는데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아주 작다. 이 작은 씨에서 예쁜 흰색, 보라색 도라지꽃이 핀다고 생각하니 신기하다.
이렇듯 마을에 사는 젊어야 60대이고 대부분 80대 여성들은 ‘때 되면 해야 할 일’로 쉴 새 없이 바쁘다. 때 놓치면 안 되는 일이 농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몸을 놀려 쉬지 않고 일한다. 우리나라 1차 산업 농업의 종사자이면서 ‘식구 먹거리’ 조달자로 아예 무보수 또는 아주 낮은 보수를 받는, 생존 피라미드의 바닥에 위치한다. 그들의 낮은 보수 노동이 있기에 도시인들은 값싸게 먹고 생존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농가 수입이 이렇듯 박하니 농촌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소중한 농산물을 그 가치만큼 제대로 대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정읍에 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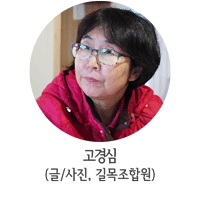
 정읍댁 단풍편지 7 - 새로운 관계의 그물망에 걸리다
정읍댁 단풍편지 7 - 새로운 관계의 그물망에 걸리다







